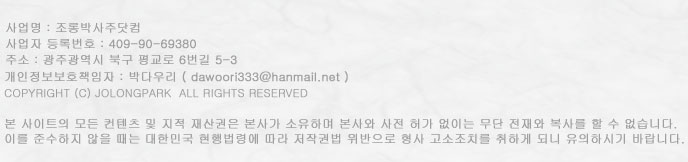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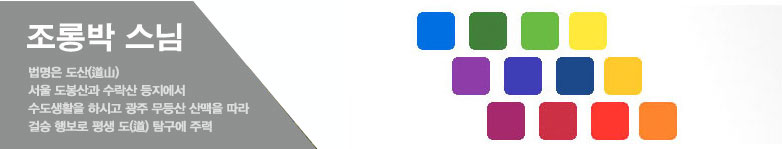

내 주제에 무슨 도를 닦는다고.
산 따라 물 따라 40여년 흘렀지만 깨우친 것 하나 없으니 땡땡이중이 따로 있겠는가!
서울 도봉산에 광주 무등산에 수도 생활 합네 하고 여기저기 신세지며 알곡만 축냈으니
필시 나는 거렁뱅이 중임에도 틀림없다.
도산(道山)이라는 그럴싸한 법명을 가슴에 달고. 도를 캐먹고 도에 살다가 도에 묻혀 죽는다는
미명 아래 세발도 안 되는 장대 쳐들고 별을 따려 했던 내가 이제는 부끄럽기만 하네.
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스님들과 영통하고 도통한 선인들 한국 땅에 많다 하던데
이제 눈 어둡고 귀멀어 찾을 길 없고 지팡이 의지하고 오리만 가도 허기진 뱃속에선 찬바람만 나는구나.
이 어찌하겠는가!
이제야 밑 빠진 항아리 들여다보듯 사주팔자라도 보며 연명하려 하니
어딘가 좀 떨떠름한 마음 금할 길 없다.